
정부가 '플랫폼 공룡'의 반칙행위를 막는 카드로 공정거래법 개정을 공식화하면서, 당초 추진된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제정은 사실상 백지화됐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던 '온라인 플랫폼법'(온플법)이 윤석열 정부 들어 폐지된 데 이어 플랫폼법마저 엎어지면서 '플랫폼 규제 법제화'가 한 걸음 더 후퇴했다는 평가다.
사전지정제도의 대안으로 내놓은 '사후 추정'에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매출 기준과 점유율 요건이 설정되면서 쿠팡과 배달의민족(배민) 등 주요 온라인 플랫폼들은 규제를 피해 갈 가능성이 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당초 밝힌 '사전 지정' 방식이 아닌 '사후 추정' 방식을 통해 지배적 플랫폼을 특정하겠다고 밝혔다.
유럽연합(EU)의 디지털 시장법(DMA) 등에서 채택하고 있는 사전 지정 방식은 매출액, 점유율, 이용자 수 등을 고려해 지배적 사업자를 미리 정해 공표하고, 관련 법 위반에 대해 처벌하는 방식이다.
반면 공정위가 꺼내든 사후 추정 방식은 실태조사를 통해 매출액과 점유율 등을 파악한 뒤, 법 위반 행위가 발생하면 지배적 플랫폼에 해당하는지 판단해 처벌하는 구조다.
쉽게 말해, 법 위반 행위가 발생하면 사후적으로 지배적 사업자 여부를 가리겠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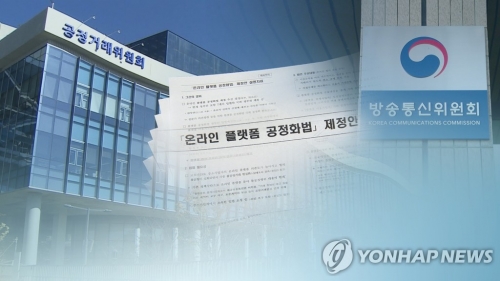
지배적 플랫폼을 사후 추정하는 요건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개정안은 ▲ 1개 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60% 이상이고 이용자 수가 1천만명 이상인 경우 또는 ▲ 3개 이하 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85% 이상이고 이용자 수가 2천만명 이상인 경우를 지배적 플랫폼 지정 요건으로 정했다.
다만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연간 매출액 4조원 이하 플랫폼은 규율 대상에서 빠진다.
지난해 매출액을 기준으로 개정안에 담긴 '사후 추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은 구글과 애플, 카카오, 네이버 정도로 분석된다.
쿠팡이나 배민 등 플랫폼들은 매출액 또는 시장 점유율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연합뉴스>


